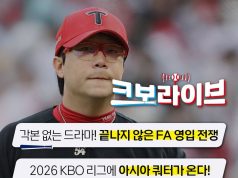[SIRI = 권소현 기자] 야구의 국경이 허물어졌다. 2025시즌부터 KBO리그에 ‘아시아 쿼터’ 시대가 열린다. 각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에 더해 아시아 국적의 선수를 1명 더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연봉 상한선은 20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는 이 제도가 한국 야구의 ‘판’을 어떻게 흔들지, 기대와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는 현장을 진단해 본다.
왜 야구만 늦었나? ‘순혈주의’와 ‘인프라의 딜레마’
축구, 농구, 배구는 이미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해 쏠쏠한 재미를 봤다. 프로야구는 왜 이제야 빗장을 풀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선수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굳건했던 보수성 때문이다.
야구는 타 종목에 비해 자국 리그의 팜 시스템이 체계적이다. 때문에 “어설픈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느니 우리 유망주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일본과의 실력 격차를 고려할 때, 자칫 일본의 2군 혹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KBO를 점령할 수 있다는 ‘리그 수준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저출산과 아마추어 야구의 저변 약화로 ‘쓸 만한 투수’가 씨가 말랐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FA 시장의 거품과 달리, 정작 마운드의 질은 떨어지는 ‘풍요 속의 빈곤’이 계속되자 결국 KBO도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
타 종목의 거울: ‘가성비’와 ‘스타성’의 양날의 검
먼저 도입한 종목들의 사례는 야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구의 경우, 지난 시즌 정관장의 ‘메가(인도네시아)’ 돌풍은 아시아 쿼터의 모범 답안이다. 전력 상승은 물론, 동남아 팬덤을 유입시키며 마케팅 대박을 터뜨렸다. 농구 또한 필리핀 가드들의 유입으로 리그의 속도와 기술이 한 단계 올랐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축구에선 동남아 선수 영입을 통해 시장 확장을 노렸으나, 피지컬과 전술 적응 문제로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공통점은 명확하다. ‘실력 없는 국내 선수’보다 ‘실력 있는 아시아 선수’가 리그의 질적 향상과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다만,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부작용은 모든 종목이 겪는 성장통이다.
20만 달러의 전쟁: 검증된 베테랑 vs 긁지 않은 복권
이번 KBO 아시아 쿼터의 핵심은 ‘투수’다. 타자보다는 당장 이닝을 먹어줄 투수가 급한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SG는 일본 NPB 통산 66승을 거둔 다케다 쇼타를 영입했다. 전성기는 지났지만, 경험치만으로도 KBO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화는 대만 국가대표 출신 왕옌청을, LG는 키움에서 검증을 마친 호주 출신 웰스를 택했다. 두산은 일본 독립리그 평자책 ‘0’의 신화 다무라를 불펜으로 수혈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성비’다. 20만 달러라는 제한된 금액 안에서 구단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기회의 박탈’인가, ‘공정한 경쟁’인가?
아시아 쿼터 도입을 두고 가장 뼈아픈 지적은 “국내 유망주들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우려다. 선발 투수 한 자리가 외국인 선수로 채워지면, 그만큼 토종 투수가 경험을 쌓을 이닝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차명석 LG 단장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도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국내 선수 육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프로는 ‘국적’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무대다.
팬들은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을 찾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준 높은 경기력이지, 실력이 부족한데도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운드에 올라 볼넷을 남발하는 모습이 아니다.
만약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대만 투수나 일본 독립리그 출신 투수가, 억대 연봉을 받는 국내 투수보다 공을 잘 던진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한국 야구에 대한 통렬한 ‘죽비’ 소리다. 이른바 ‘메기 효과’다.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은 정체된 연못(KBO)의 물고기(국내 선수)들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경쟁에서 밀려난다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공정한 기회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것이 냉혹하지만 명확한 프로 스포츠의 생리다.
KBO의 실험, 성공의 조건은?
아시아 쿼터는 이제 막 첫발을 뗐다. 20만 달러라는 제약 때문에 ‘리그 파괴자’급 선수가 오기는 힘들다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선수(3명)에 아시아 쿼터(1명)까지 더해진 ‘4인 용병 시대’는 분명 변수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구단은 단순히 ‘싼 맛’에 선수를 쓰는 소모품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KBO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선수들에게 건강한 자극을 주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내년 시즌 마운드 위, 낯선 국적의 투수가 뿌리는 공 하나하나가 한국 야구의 미래를 묻게 될 것이다. 과연 이들은 한국 야구를 잠식할 황소개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메기가 될 것인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스포츠미디어 시리(Sport Industry Review&Information)
권소현 기자 (so_hyu@naver.com)
[25.12.08, 사진제공 = KBO 공식인스타그램]